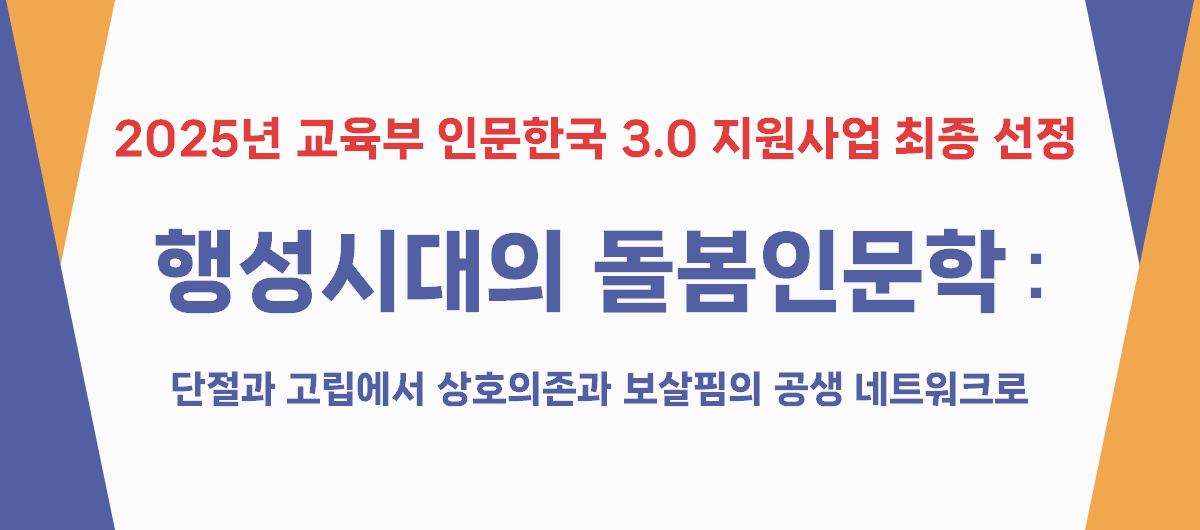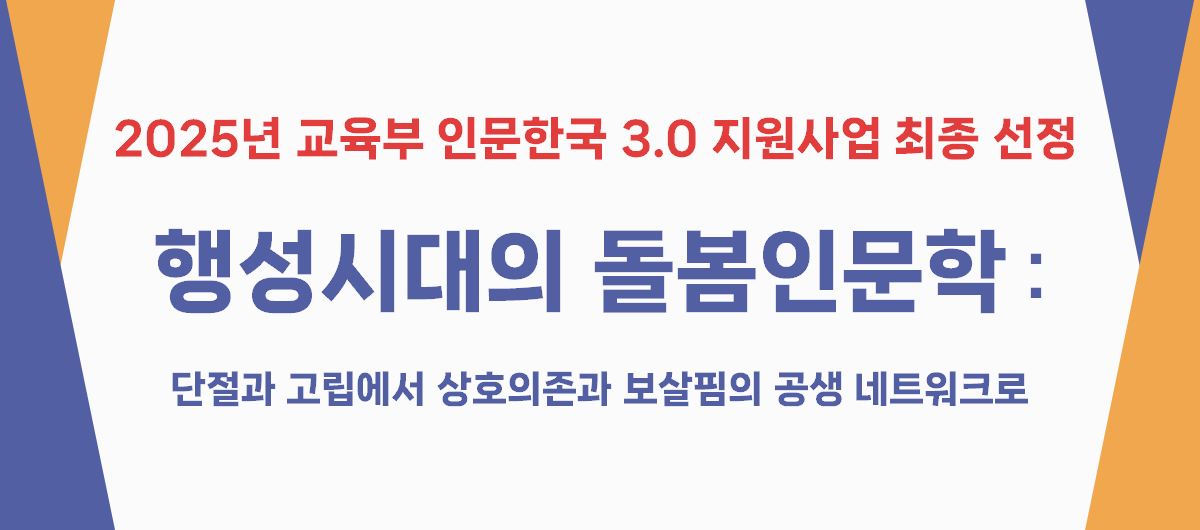공지 및 소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가 HK 3.0 행성돌봄인문학 월례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비교문화연구소는 전 지구적 위기와 각종 재난 속에서 '돌봄'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구행성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공생과 연립의 이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소의 아젠다인 '행성시대의 돌봄인문학'을 주제로, 매월 관련 문헌을 읽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월례세미나에서는 펠릭스 가타리(Pierre-Félix Guattari)의 <세 생태학>을 읽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K 3.0 행성돌봄인문학 월례세미나 #1 펠릭스 가타리 <세 생태학> 읽기 • 발제: 김재인(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일시: 2025년 7월 1일(화) 오후 3시 • 장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외국어대학관 411-1호)
2025-06-052025년 5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탐색 박람회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전공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국제캠퍼스 내 개설된 다양한 전공의 특성과 학과별 교육과정, 진로 방향을 안내하여 관심 분야 탐색과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박람회에 비교문화연구소도 외국어대학 내 부스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핵심 아젠다인 “HK3.0 행성시대의 돌봄인문학”을 소개했다. 특히 학부생 대상 ‘C2C(Care to Care)-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을 안내해 연구소가 추구하는 인문학적 비전과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였으며, 인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부스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연구소에서 기획·출간한 단행본을 증정했다.
2025-05-28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2025년 교육부 인문한국(HK)3.0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8억으로 향후 6년 동안 연구소는 <행성시대의 돌봄인문학: 단절과 고립을 넘어 상호의존과 보살핌의 공생 네트워크>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04-01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서울대 미국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2025년 Critical Islands Studies <군도적 전환과 다른 아시아(들): 문학, 정치, 역사 속에서의 행성돌봄> 의 홈페이지가 오픈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적 연대를 상상하고 디자인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최기간: 2025년 8월 4일 - 6일 • 개최장소: 제주대학교 • 기조강연자: Gayatri Chakravorty Spivak 교수 (미국 컬럼비아 대학) • 홈페이지: https://jejucis.wordpress.com/?fbclid=IwY2xjawJHCNVleHRuA2FlbQIxMQABHYMZon7CmVU6Gtm_ZwL9NeA9rxXEEhguF0sRQcvNUiAn8s5uFganp3j2xQ_aem_n7e8MM2dKXF3YYIpN5BYVQ
2025-03-19Call for Papers An Archipelagic Turn and the “Other Asia”: Literature, Politics, Culture August 4-6, 2025 Jeju National University Keynote: Gayatri Spivak, Columbia University, US The Critical Island Studies Consortium announces a conference that aims to fundamentally challenge and reconceptualize our understanding of “Asia” by privileging an archipelagic perspective over the dominant continental narrative. In an era where global power dynamics increasingly revolve around Asia, we propose a radical reframing of how we understand this region. and its place. The persistent continental bias in interdisciplinary scholarship, particularly endemic in certain disciplines like Asian Studies, has created a fundamental misrepresent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relations. This conference proposes a radical epistemological shift: understanding Asia primarily through its archipelagic character rather than its continental mass. While traditional scholarship has positioned Northeast Asian continental powers as the center of “Asia,” this framework has obscured the rich, complex networks of maritime connections, island cultures, and archipelagic relations that have historically defined and continued to shape the region. Our theoretical foundation draws from multiple critical thinkers who have challenged continental-centric epistemologies. As Gayatri Chakravorty Spivak says, “we cannot turn planetarity into the production of an adjective for ourselves.” There is an ever-present risk that a global, all-encompassing representation or worldview might create its distorted reality, detached from the physical world. In constructing such overarching narratives, we may overlook the Earth itself, echoing the concerns and anxieties expressed by modernist thinkers. The imperative of our planet demands that we rethink its essence. Édouard Glissant’s assertion that “the archipelagos of the Mediterranean must encounter the archipelagos of Asia” suggests that archipelagic thinking offers an alternative perspective but an on the ontological condition of our contemporary world. This vision challenge resonates with Gilles Deleuze’s ontology of islands, which understands archipelagic spaces as existing in the productive tension between separation and connection, between continent and ocean. This ambiguous position—simultaneously yearning for separation from the mainland while maintaining complex networks of connection—offers rich theoretical ground for reconceptualizing the basic concepts and categories in interdisciplinary scholarship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sia, viewed in a historical context. of Asian Studies. The name “Asia” itself reveals the problematic nature of continental-centric thinking. Originally denoting regions outside the Roman Empire before being transformed into a signifier for Greater China, it represents an arbitrary geopolitical categorization that reflects Western imperial interests rather than regional realities. The post-war Cold War system further entrenched this continental bias, dividing what was once an interconnected maritime world according to Western strategic interests. This historical context demands a fundamental rethinking of how we approach conceptualize Asian Studies. We recognize that islands are not peripheral to Asia but constitute its essential character—a reality that continental-centric narratives have systematically marginalized. This marginalization has not only distorted our understanding of the past but continues to shape contemporary geopolitical and economic frameworks in ways that privilege continental perspectives. The conference seeks to develop several critical theoretical interventions through archipelagic ontology, maritime epistemologies, and island agency. First, we aim to explore the nature of archipelagic existence beyond continental framework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ion and connection, and developing new conceptual tools for archipelagic thinking. Second, we seek to center maritime networks as primary rather than secondary phenomena, developing knowledge systems that emerge from archipelagic experiences and challenging land-based assumptions in knowledge production. Third, we propose reconceptualizing islands as active agents rather than passive spaces, understanding island-mainland relations beyond dependency frameworks, and exploring island-based forms of resistance and creativity. Through these interventions, we address crucial questions: How might we understand Asia differently if we prioritize archipelagic perspectives over continental ones? What alternative histories emerge when we center maritime networks and island experiences? How does an archipelagic framework challenge current geopolitical and economic paradigms? What new methodologies are required for archipelagic thinking? These questions demand innovative methodological approaches that privilege island perspectives and incorporate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into archipelagic methodologies. The conference aims to establish archipelagic thinking as a fundamental approach in the field to Asian Studies, that could help develop new methodological tools for island-centered research, create networks of scholars committed to archipelagic perspectives, and produce publications shaping future research agendas. We seek to foster dialogue between island-based and continental scholars, working toward a more sophisticated incisive and inclusive understanding of Asian histories, cultures, and futures. We particularly welcome papers that explicitly challenge continental-centric approaches through archipelagic frameworks, by engaging with but not limiting to any of these topics: 1. Theoretical Interventions - Critiques of continental-centric Asian Studies - Archipelagic methodologies and epistemologies - Maritime networks as alternative organizing principles - Island ontolo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understanding 2. Historical Reconfigurations - Pre-colonial maritime networks and their disruption - Alternative histories centered on island experiences - Maritime trade networks as primary rather than secondary phenomena - Island-based resistance to continental hegemony 3. Contemporary Implications - Rethinking geopolitics through archipelagic frameworks - Island economies as alternatives to continental capitalism - Maritim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reconceptualization - Environmental challenges from archipelagic perspectives 4. Cultural Dynamics - Island-based cultural formations and their resistance to continental narratives - Maritime cultural networks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their challenge to continental epistemologies - Archipelagic arts and literature Submission Requirements Abstracts should explicitly address how their research challenges continental-centric approaches and contributes to archipelagic understanding of Asia. We particularly encourage submissions from scholars based in or focusing on island territories. - Abstract: 300-500 words - Must include theoretical framework - Must explicitly address continental/archipelagic dynamics - Include five keywords - Brief biographical note (150 words) Important Dates March 31, 2025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an abstract and a short bio April 15, 2025 Authors will be notified via email ㅤㅤSelected papers will be considered for a volume on archipelagic perspectives and approaches, aiming to establish this framework as a significant intervention in the field. Organizers: Critical Island Studies Consortium, https://criticalislandstudies.com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 https://tamla.jejunu.ac.kr Center for Cross-Cultural Studies (Kyung Hee Univ.), https://ccs.khu.ac.kr/?language=eng SNU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 https://amstin.snu.ac.kr/en/ Contact Alex Taek-Gwang Lee alextglee@gmail.com Lulu Reyes lu2reyes3x@gmail.com References Deleuze, Gilles. Desert Islands: and Other Texts, 1953–1974. Tran. Mike Taormina. New York: Semiotext(e), 2004. Glissant, Édouard. The Baton Rouge Interviews. Trans. Kate M. Cooper.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20. Spivak, Gayatri Chakravorty and Susanne M. Winterling. “The imperative to make the imagination flexible.” Planetary Sensing https://planetarysensing.com/the-imperative-to-make-the-imagination-flexible/
2025-01-20아카이브
[김재인 교수] 인공지능 붐의 시작, 인공지능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는?ㅣ지혜의 숲 시즌3 [ep3-1] [김재인 교수] 인류 최초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의 이 도구ㅣ지혜의 숲 시즌3 [ep3-3]
2024-07-312023년도 버틀러 캠프 "알튀세르와 푸코 사이의 버틀러: 구조로서의 현행성의 정치철학을 위하여" (배세진, 연세대)
2024-07-08좀비는 실제로 있었다? 아이티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 [세계의 나쁜놈들: 아이티좀비 편 | 박정원 경희대 교수 | 스브스뉴스 | 인덕션] 150년 동안 프랑스에 빚 갚다 제일 가난해진 나라 [세계의 나쁜놈들: 아이티 좀비 편 | 박정원 경희대 교수 | 스브스뉴스 | 인덕션]
2024-06-17기술은 예술의 자원일까? 위협일까? 기술시대의 예술의 미래, 책으로 만나는 AI시대의 예술(김재인 교수)
2024-05-20The 2023 ICCTP Conference | Theorizing Global Authoritarianism: To Reclaim Critical Theory Against the Grain, 9th-11th June, Kyung Hee University Jie-Hyun Lim, "Reading the Mass Dictatorship in the Age of Neo-populism"
2023-07-24출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소설 『컴퍼트 우먼』 출간 이후 전미도서상 수상! 엘리엣 케이즈상 수상! 전율이 돋는 강렬한 서사에 서정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소설 노라 옥자 켈러의 『컴퍼트 우먼』은 영어권 문학작품 중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거의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컴퍼트 우먼』은 1945년 해방이 되고도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하며 참혹한 고통의 기억을 짊어지고 외롭게 사라지고 지워진 ‘위안부’ 피해 여성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들을 위한 애도 방안을 한 어머니와 그 딸의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이다. 즉 ‘위안부’ 엄마 아키코와 그의 딸 베카가 번갈아가며 각자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위안부’ 엄마 아키코는 식민의 역사 속에서 열두 살에 일본군에게 팔려 위안소에서 어린 시절의 순효라는 이름 대신 일본군이 붙여준 이름 아키코가 되어 ‘위안부’가 되었다가 열네 살에 위안소를 탈출한다. 이후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결혼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이민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같은 위안부였던 ‘인덕’의 혼을 받아들여 귀신 들리게 되는데, 신들린 엄마 아키코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딸 베카의 성장 서사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상처 받은 엄마 아키코와 그 엄마와 그 엄마의 삶들이 기억과 회상과 신화와 설화 등과 함께 교차하면서 펼쳐진다. 딸 베카는 엄마 아키코가 죽고 나서야, 엄마의 삶과 고통을 추적하며 그 고통을 둘러싼 진실과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며, 결국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가로놓인 언어적·국가적 장벽과 세대적 간극을 넘어 과거와 현재, 생과 사를 초월하여 화해한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이나 판단 없이 엄마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This new reading of Gilles Deleuze forges a link between his early and later works by decoding his hidden agenda for communism. Encoded in the idea of 'the Third World', Deleuze used his concept of communism as a bulwark against fascist politics and the liberal political economy. Inspired by May 68 and its aftermath, these concealed interpretations of Marx are now tacitly forgotten but can unlock a deeper understanding of Deleuze's political project. Often regarded as an apolitical philosopher, the challenges that Deleuze mounted to structuralism are easy to overlook. By reinvigorating the communist aspect of his political project and linking his ideas to Alain Badiou, Jacques Rancière and Slavoj Žižek, Alex Taek-Gwang Lee reveals Deleuze's objective: to rescue Marxism from the dogmatic status quo and revive its political agendas. This major undertaking situates his ideas alongside and sets out a new framework for reading the significance of Marxist thought in postwar France. Ultimately, this new understanding of Deleuze's critique of global capitalism opens up his vision of materialistic politics as a means of shaping the people and the proletariat of the future.
‘융합’, ‘복합’, ‘통섭’, ‘초학제’ 등 표현은 다르지만 이러한 흐름이 유행을 탄 지 꽤 오래되었다. 구분 짓기, 경계 짓기로 점철된 근대적 교육을 극복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은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전설 속 르네상스형 인간을 이상형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르네상스 시대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지식의 양이 극도로 방대해지고 전문화가 심화된 오늘날,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춰 융합을 이루어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저자는 ‘공동 뇌’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한다. 융합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발생한다. 융합은 개인의 뇌가 아니라 개인 뇌들의 만남의 장소, 즉 공동 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공동 작업의 산물로서 창의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전승된다. 보존되고 누적되고 전승된 인류 전체의 기억이 바로 공동 뇌인 것이다. 이러한 융합과 창의성을 위한 소통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의 자연어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된 언어력, 확장된 인문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확장된 언어력, 확장된 인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공통 핵심 역량 교육이다. 이 책은 ‘공동 뇌’를 중심으로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제 끝장일까? 넘치는 기대와 불안 속,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인공 지능의 핵심을 파고들어 인간을 재발견하기까지 과학 철학자 김재인의 특별한 미래 수업 인공 지능 앞에서, 인간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을까? 과학 철학자 김재인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한다. 니체, 들뢰즈 등 현대 철학을 기반으로 과학 철학까지 확장해 오며, 인공 지능 연구에서 독보적인 학자로 자리매김한 김재인은, 인공 지능과 인간을 대조해 볼수록 인간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커진다고 말한다. 『인간은 아직 좌절하지 마』는 그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과 연구를, 청소년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쓴 책이다. 이 책에서는 급부상한 생성 인공 지능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룬다. 생성 인공 지능의 바탕인 초거대 언어 모델의 원리를 설명하며, ‘글로만 공부한’ 인공 지능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에 이어 로봇은 인간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 인공 지능은 왜 눈치가 없는지, 왜 인공 지능은 윤리적 판단, 예술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지 등등 설득력 있는 분석이 차례로 이어진다. 기초적인 설명에서 시작해 철학적 사유까지 단숨에 다다른다. 흥미롭게도 인공 지능을 파고들수록, 미처 몰랐던 인간의 역량을 새로이 깨닫게 된다. 그 탐구 끝의 당부는 자못 감동적이다. 저자 김재인은 인류는 늘 집단적으로 창의적이었음을 설명하며, 우리는 지금도 ‘교육’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인공 지능 시대,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자 하는 청소년은 물론, 교육의 의미를 숙고하는 교육자와 시민들에게 각별히 의미 깊은 책이다.
저에게 세상의 끝에서 읽을 단 한 권의 책을 묻는다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힘들고 사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끝까지 가져갈 단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작품 중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독보적이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수천 년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존재하는 것 중 최고의 책이며, 진정 높은 공기의 책으로, 인간 만사가 그 아래 엄청나게 멀리 놓여 있다. 나아가 이 책은 가장 깊은 책으로, 진실의 가장 안쪽 풍요로부터 태어났으며, 어떤 두레박을 내려도 금과 특등품이 가득 차 올라오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서설 4절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가 거센 파도를 일으킨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다. 하지만 과연 세상은 그만큼 더 나아졌을까? 미국의 페미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인 수전 팔루디가 1991년 ‘백래시’라고 명명한 남자들의 반격은, 2024년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지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스티프트: 배신당한 남자들』은 1999년 처음 세상에 나온 뒤 2019년 20주년 기념판이 출간된 수전 팔루디의 대표작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국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백래시』와 『다크룸』 사이에 위치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신화를 불식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다. 앞서 『백래시』 한국어판 해제를 집필하고 『다크룸』을 우리말로 옮긴 문화평론가 손희정의 번역으로 ‘팔루디 연작’의 주요 저작 세 권이 국내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책에서 팔루디는 “아버지들이 물려준 세상에, 남성성이라는 신화에 배신당한(stiffed) 남자들은 어째서 여성들에게 분노할 뿐 사회에 저항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 아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6년여에 걸친 방대한 취재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역사학·사회과학·심리학 등을 넘나들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펼쳐 나가는 이 방대한 르포르타주는, 단 한 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가다가 어느새 지금 우리의 질문과 맞닿게 될 것이다.
라디오, 방송, 유튜브, 신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전방위로 오가며 대중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온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을 겪으며 지난 3년간 공글린 사유의 기록. 그는 지구 행성적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가속을 늦추지 않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알고자 부단히 읽고 보았고, 여기에 거대서사가 지워버린 작은 것들과 함께해온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조각보’처럼 이어진 사유의 목록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 너머를 말하되 파괴적인 인간 혐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는 혐오와 냉소에 빠져 “우리 다 망했다”라고 비명을 지르기보다 다양한 사유의 얽힘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휴머니즘, 발전주의 진보사관, 부계혈통주의, 이성애중심주의, 군사주의, 자본주의, 종차별주의 같은 근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대항 역능(puissance)의 마디들인 쑬루세, 신유물론, 페미니즘, 오드킨, 포스트휴먼, 돌봄/의존, 레퓨지아가 바로 그것이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와 오드킨, 포스트휴먼의 구체적 형상을 보여주는 <서던 리치: 소멸의 땅>,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다양한 생명 종의 피난처, 레퓨지아에 대한 이야기 <스위트 투스>, 그리고 쑬루세의 진정한 의미를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수라>까지. 페미니즘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관람과 독서 목록,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과 비평은 인식론적 전환을 일으키는 대안 담론들을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난/ 디지털 기술/ 능력주의는 어떻게 외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외로움은 어떻게 개인을 넘어 사회까지 무너뜨리는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외로운가? 인류는 어떻게 외로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2018년 1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 탄생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외로움과 맞서 싸우기」라는 보고서를 보면, 수많은 이들이 외로움에 ‘자주 혹은 항상’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들 중 압도적인 수가 TV가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사람들이 고립되고 공동체가 단절된 상황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대략 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로움이 단지 개인의 정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사해 주는 지점이다. 외로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외로움과 생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다. 한국 또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다. 인구의 26%가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엔 그 수치가 40%까지 치솟는다. 지금 세계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문만 열면 바로 다른 이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놀라운 기술의 발전 덕에 모두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21세기를 ‘외로운 세기the lonely century’라 이름 붙였다. 외롭거나 외로워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아낼 순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접근해 보는 건 가능하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분명 우리를 이렇게 만든 21세기만의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철학이 할 일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첫 장은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외로움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영어권에서는 16세기까지 외롭다는 단어가 없었으며, 이 감정은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것이었다.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을 더욱더 외롭게 만드는 원인은 가난, 디지털 기술, 데이터가 지닌 편향성, 능력주의 등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에 더해 외로움으로 뒤덮인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들을 짚어 가며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엔 어떤 식으로 외로움에 맞설 것인지, 조금은 서투르더라도 함께 그 대안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늦은 나이에 어린 생명을 이 세상에 오게 한 아빠로서, 그 아이가 더는 외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책을 썼다. 그 여정에 많은 이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 - 도서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K692936651&start=pnaver_02
-저자 : 김재인 -도서링크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start=short&ItemId=317056253 -도서리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73965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9948 https://naver.me/FCBpBZLc -책소개 : AI 발전 전망을 둘러싼 대논쟁의 시대 AI 빅뱅을 인문학 르네상스로 역전시키는 철학자 김재인의 날카로운 통찰 2023년 3월 챗GPT-4의 등장으로 AI 발전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압도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전문기술 분야와 학계, 일상에 가득하다. AI 대부이자 딥러닝 개념을 처음 고안한 제프리 힌튼 교수는 올 5월 AI 위험성을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구글을 떠난 바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 처음 열린 AI 청문회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통제되지 않은 AI가 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간은 과연 기계에 지배당할 것인가?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 오랜 기간 과학기술의 변화를 분석해온 철학자 김재인은 논쟁의 구도를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가?”라는 지배 담론에서 “인간은 어떻게 기계와 공생할 수 있는가?”라는 대안 담론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시도를 한다. 주어를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두고 사유하는 저자의 인문학적 통찰은 AI 발전을 둘러싼 대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든다. 생성 인공지능의 원리를 통해 한계를 도출하고, 그 한계에서 인간의 고유함을 돌아보는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최상의 안내서로 기능할 것이다. AI 빅뱅 시대를 역설적으로 인문학 르네상스로 보는 철학자 김재인의 시선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철학의 쓸모와 반등하는 인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발 플럼우드 저 (김지은 옮김) -도서링크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12156236 -책소개 : “하지만 인간은 먹이입니다.” 페미니스 생태철학자 발 플럼우드가 악어에게 잡어먹힐 뻔한 경험을 통해 직면한 인간과 자연의 가장 비밀스러운 진리.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나이 들어 자연사할 수도 있고, 병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날 수도 있다. 불운한 사고나 범죄도 배제할 수 없는 사인 중 하나다. 그 과정과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는 것은 가장 확고한 진리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감히 떠올리기조차 두렵고 잠시 스쳐 가는 것만으로 몸서리치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악어의 눈』의 저자인 페미니스트 생태철학자 발 플럼우드는 그러나 인간은 먹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1985년 호주의 카카두국립공원에서 카누를 타다 악어를 맞닥트려 ‘죽음의 소용돌이’를 세 번이나 당한 그는 강렬한 금빛 테두리가 빛나는 포식자의 눈을 마주한 순간 지금껏 안온하게 몸담아 온 세계에 일어난 균열을 느낀다.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로서 모든 비인간 존재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구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깨어지며 인간도 다른 모든 생명 존재와 마찬가지로 먹이사슬 안에 위치한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플럼우드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담담히 공유하며, 스스로 주인이길 자처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생태적 관점에서, 비인간 존재를 윤리적 관점에서 다시 위치시키는 두 과제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비인간, 문명과 자연,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생명 존재가 몸인 만큼 정신이며, 마땅히 존중 받는 동시에 차례가 돌아오면 먹이로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무겁고 인정하기 벅찬 이 이야기를 플럼우드는 시종일관 다정한 목소리로 전달한다. 그는 악어에게 잡아먹힐 뻔한 압도적 경험을 비롯해 10년 넘게 집 안팎을 오가며 삶의 일부를 함께한 웜뱃 비루비와의 추억, 아들의 묘지를 방문하며 서구 매장 관행에 대해 돌아본 경험을 나누면서 이런 관점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근본적으로 삶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악어의 눈』은 우리가 눈감아버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 진실에 용기 내어 다가가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책이다. 다른 생명을 취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믿음직한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